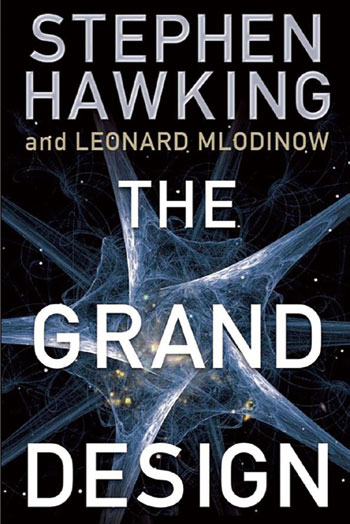
3월 31일 토요일 스티븐 호킹(1942~ 2018)의 영결식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성모(聖母)교회에서 엄수됐다. 생전에 “신은 없다”고 주장했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절 바로 전날 성모의 품에서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그에게 바쳐진 조사(弔辭) 가운데 압권은 “큰 별이 우주로 돌아갔다”였다. 그야말로 우주물리학의 ‘큰 별’이었다.
그는 일찍이 ‘시간의 역사’(1988)로 우리에게 익숙하다.(주간조선 2396호 참조) 일반적으로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따라서 ‘시간의 역사’란 시간은 물론이고 공간이나 우주도 유한한 존재라는 함의을 담고 있다. 이것이 곧 빅뱅이론의 핵심 메시지다. 일반인들은 이 책을 통해 빅뱅이론을 수용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과학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했다.
흔히 위대한 과학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How’에 천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Why’로 눈길을 돌린다. 호킹에게 이 Why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설계’(The Grand Design·2010)이다. 제목만 보면 이 책은 마치 위대한 설계자, 곧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찬찬히 읽다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런 제목이 붙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킹은 다소 도발적인 발언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철학은 이제 죽었다. 철학은 현대과학의 발전, 특히 물리학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했다. 지식이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에서 발견의 횃불을 들고 있는 자들은 과학자다.” 전통적으로 Why는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과학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믿음이다.
잘 알다시피 고전물리학은 독립된 객관적 실재가 존재한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은 그런 고전적 실재론을 부인한다. 둥근 어항과 평평한 사각 어항에 사는 금붕어가 내다보는 바깥세상은 다르다. 어느 쪽이 실재냐 하면 둘 다 각각 실재다. 이런 관점을 모형의존적 실재론(model-dependent realism)이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모형이 실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오로지 그것이 관찰에 부합하느냐는 질문만 유의미할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모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천동설은 지동설로 대체되었고 고전물리학은 상대성이론이나 양자물리학의 등장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고전물리학은 원자나 입자 등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력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원자나 입자 등은 일상 세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들은 관찰을 위해 빛을 비추면 그 빛에 의해 변화되기도 한다. 이런 분야를 다루는 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이다.
그런 세계에서는 정확한 예측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원자, 입자 등)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늘 동요상태(fluctuation)에 놓여 있다. 따라서 거기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불확정적이다. 오로지 다양한 확률의 스펙트럼만 존재한다. 달리 말해 과거-현재-미래가 단선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다양한 대안적 역사들(alternative histories)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확정된 객관적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찰자의 관찰 방식에 의해 실재가 구성된다. 우리의 우주도 우리의 모형을 통해 바라본 우주일 뿐이다. 따라서 그밖에도 대안적 역사를 가진 대안적 우주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즉 “우주 자체도 단일한 역사를 지니지 않았으며 심지어 독립적인 (객관적) 존재가 아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이론적으로 10500개나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른바 다중우주(multiverse) 이론이다.
우리의 우주는 빅뱅을 시작으로 여러 조건들이 아주 정밀하게 조정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어떤 조건이 하나라도 조금만 달라졌어도 지금과 같은 우주는 존재하기 어려웠다. 지구상의 생명체도 수많은 조건들이 기적적으로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즉 오늘날 모습으로 우주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엄청난 행운과 기적이다. 만약 우리의 우주만 단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저절로 신의 존재를 떠올려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수한 우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수많은 우주들은 상이한 초기 조건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대안적 역사를 형성하며 다양하게 진화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중력, 전자기력(電磁氣力), 핵력(nuclear force) 등 자연의 힘이다. 따라서 우주의 탄생에 굳이 창조라는 말을 붙이자면, 그것은 자연법칙에 의한 ‘자발적’ 창조인 것이다.
“과학은 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현대과학은 양자물리학과 상대성이론을 뛰어넘어 다중우주의 자발적 창조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통일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그런 야심 찬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다양성으로 가득 찬 광활한 우주를 예측하고 기술하는 유일무이한 이론’이 된다. 아쉽게도 현재로선 개념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언젠가 그런 이론이 정립되어 관찰에 의해 입증된다면 마침내 “우리는 ‘위대한 설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일우주만 상정하면 우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여전히 Why가 남을 소지가 있다. 왜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러나 다중우주를 상정하면 Why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기적은 우리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다. 다중우주의 원리, 즉 ‘위대한 설계’의 일부일 뿐이다. 이처럼 다윈이 ‘진화론’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밝혔듯이, 호킹은 ‘위대한 설계’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자 했다.
‘위대한 설계’가 규명된다면 그가 모두(冒頭)에서 호언했듯이 철학이나 종교는 없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위대한 설계’의 실재 자체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또한 설사 그것이 실재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하기란 여전히 요원하다. 그럼에도 그는 통일 이론의 실재를 믿었고 도달 가능성도 믿었다.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에는 그의 존재가 너무 유한했다. 이것이 언제 결말 날지 지금으로선 전혀 알 수 없다.
그는 ‘시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다 완전한 이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간 이성의 궁극적 승리이며 그때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신의 마음을 안다’는 결국 ‘신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는 “우주는 결코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과학은 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의 예언대로 설사 ‘위대한 설계’가 밝혀지더라도 과연 우리에게 신이 불필요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는 생전에 “내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꾸며낸 동화”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우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부활절 전날 장례식을 거행한다. 또한 그는 “신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의 유해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묘지에 봉안될 예정이다. 그는 거기서 뉴턴과 다윈의 이웃이 된다고 한다. 그의 평안한 영면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