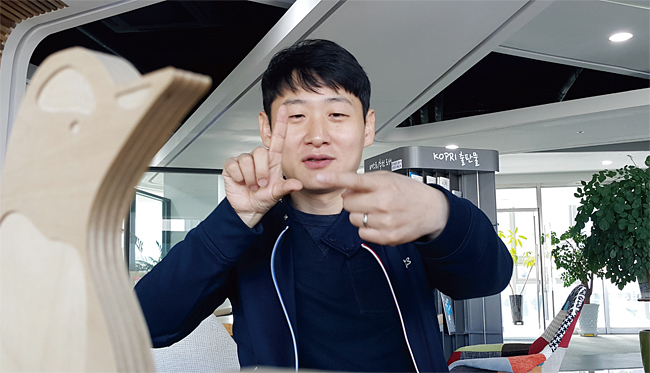
이원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펭귄 뒷조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웃으면서 자신을 표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매년 남극 세종기지에 가서 두세 달씩 머무르며 ‘펭귄’ 연구를 했고, 이를 ‘물속을 나는 새’(사이언스북스)라는 제목의 책으로 써냈다. 10월 11일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이원영 박사를 만났다.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해안을 따라 걸어가면 ‘펭귄마을’이 있다. 턱끈펭귄과 젠투펭귄 두 종이 5000마리 산다. 이 두 종을 4년간 연구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턱끈펭귄과 젠투 펭귄은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들여왔다. 이 두 종은 몸길이 60㎝로 비교적 작은 펭귄에 속한다. 턱끝펭귄은 턱에 검은색의 끈을 두르고 있는 모양새여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그는 이 두 종 펭귄의 ‘뒷조사’를 위해 소형 비디오카메라, GPS, 수심기록계, 가속계 등을 사용했다. 펭귄의 머리에는 가속계, 등에는 다른 장치를 부착한다. 과거 펭귄의 가슴에 안전벨트를 채우며 각종 측정장비를 달았던 때와는 달라졌다. 큰 장비는 펭귄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 박사는 “요즘은 사람 검지손가락만 한 걸 펭귄 등에 부착하는데 무게가 14g 정도”라고 설명했다.
펭귄의 털을 약간 들어올리고 장비를 방수테이프로 싸서 고정시키는데 한 번 부착하면 1주일 정도는 몸에 붙어 있다. 나중에 장비를 회수해서 펭귄이 뭘 하고 다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가속계 기록을 보면, 펭귄이 어떤 먹이를 몇 회 먹었는지 알 수 있다. 펭귄이 물속에서 먹이를 물 때는 고개를 급속하게 앞으로 내민다. 때문에 가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패턴의 숫자를 세면 먹이를 몇 번 먹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펭귄의 주요 먹이는 크릴이다. 크기는 4㎝ 정도. 크릴을 한 마리씩 펭귄이 입에 무는데, 크릴을 물 때는 고개를 움직인다. 즉 입의 각도가 달라진다. 이 각도를 따지면 펭귄이 크릴을 몇 마리 삼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심기록계를 보면, 펭귄이 몇 시간 잠수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박사는 펭귄이 200m까지는 어렵지 않게 잠수할 수 있으며, 황제펭귄의 경우는 600m까지 잠수한다고 했다. 수심기록계로는 펭귄의 암수 한 쌍이 몇 시간 간격으로 둥지를 돌아가며 지키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하루의 절반은 암컷이, 다른 절반은 수컷이 둥지를 떠나 먹이 사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박사가 수심기록계 기록을 보니, 암수가 물에 들어갔다 뭍으로 나온 시간을 알 수 있었다. 평균 9.5시간 간격으로 암수 한 쌍이 임무교대를 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 박사가 연구한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은 한 구역에서 산다고 할 정도로 서식지가 붙어 있다. 먹이가 같은 두 종은 경쟁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박사에 따르면, 먹이를 주로 획득하는 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 “펭귄은 먹이가 풍부한 곳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펭귄 마을에서 떨어진 바다에, 해저산맥이 있어 해수가 올라오는 지역이 있다. 이곳은 플랑크톤과 크릴이 많이 산다. 이곳에 펭귄이 찾아간다.”
이 박사는 “펭귄의 수영실력이 놀랍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펭귄은 시속 60㎞까지 움직인다. 때문에 ‘바닷속을 나는 새’라고 말할 수 있다.”
펭귄은 포유동물이다. 때문에 헤엄을 쳐도 물고기처럼 몸을 좌우로 흔들지 않고, 고래처럼 아래위로 흔든다. 그리고 날개로 바닷물을 밀어 추진력을 얻으며, 다리는 방향키 역할만을 한다. 이 박사에 따르면, 펭귄은 잠수에 특화된 새이다. 6000만년 전 신생대 초에 살았던 펭귄의 조상 화석이 뉴질랜드에서 나온다. 당시 펭귄의 크기는 지금보다 크다. 펭귄은 몸집을 작게 하는 쪽으로 진화했다. 신생대 초에도 펭귄은 잠수를 잘했다.
이 박사는 11월 중순 다시 남극으로 떠난다. 극지연구소 내 이원영 박사 연구실은 남극으로 가져갈 짐들로 가득했다. 일부 짐은 이미 부쳤다고 했다. 연구실 벽에는 펭귄 분류 그림이 붙어 있었고, ‘진화’를 알아낸 영국인 찰스 다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번부터는 다른 펭귄을 연구한다. ‘아델리펭귄’이라는 종이다. 프랑스 탐험가가 발견해 자신의 연인인 아델의 이름을 붙인 펭귄이다. 이 아델리펭귄은 남극의 지표동물 중 하나다. 지표동물은 남극 환경 변화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올해부터는 세종기지가 아니고, 장보고기지로 간다. 남극대륙의 장보고기지는 세종기지와는 반대편에 있다. 아델리펭귄 서식지는 장보고기지에서 가까이 있지 않고 내륙으로 쑥 들어가야 한다. 헬기를 타고 30분을 가야 한다. 이 박사를 포함해 4명의 연구자가 이 남극 내륙에 천막을 치고 매번 갈 때마다 1주일 내지 10일간 야외생활하며 아델리펭귄을 연구할 예정이다. 4년 프로젝트이다.
털 추출하고 똥 분석하고
이원영 박사는 여름에는 남극이 아닌 북극에 간다. 북극권의 그린란드에 가서 동물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그린란드의 최북단 ‘시리우스 파셋’이라는 곳에서 올해도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체류하며 연구했다. 북극 이야기는 지난해 ‘여름엔 북극에 갑니다’(글항아리)라는 제목의 책에 담았다. “시리우스 파셋 인근에는 고생대 초인 캄브리아기 화석이 널려 있다. 발에 밟히는 게 삼엽충이다. 크기는 5~6㎝. 한국의 태백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 박사는 도요물떼새 등 철새와 그린란드늑대 등 북극 동물을 연구한다. 그린란드늑대는 전 세계에 55마리 남았다. 이 늑대가 뭘 먹는지, 다른 늑대와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있다. 올여름 숙소에 늑대들이 찾아왔는데 천막에 털을 묻혀놓고 갔다고 한다. 이 박사는 그 털에서 유전자를 추출했고, 똥을 분석해 뭘 먹었는지 확인했다.
“남극과 북극은 닮아 있다. 시간이 빨리 간다. 극지 여름은 불과 한두 달이다. 극지 동물들은 이 기간에 새끼를 낳고, 키워내야 한다. 부모가 잠잘 시간도 없다. 북극의 물떼새는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하러 1주일 넘게 잠을 자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 남극의 펭귄도 먹이 구하러 나가서 1주일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간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이 박사는 서울대 생명공학부 01학번. 2014년에 까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캠퍼스 내에 있는 까치 둥지를 연구, 까치 부모가 갓 태어난 새끼에게 먹이를 어떻게 주는지를 알아냈다. 이 박사는 “까치는 잘 크는 새끼에게 먹이를 몰아주며, 아들딸을 고르게 가지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대 까치들은 자신들의 둥지에 비디오카메라를 달고, 귀찮게 하는 이 박사를 알아본다고 한다. 그가 접근해오면 달려와 쪼아댔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 박사는 “영국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주말에 축구 보러 갈래? 아니면 새 보러 갈까?” 탐조(探鳥)는 앞선 나라들의 문화라는 말이다. 한국도 탐조의 세계로 빠져들 때가 됐다고 이 박사는 말했다.
